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취임과 함께, 당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인도 관계는 예기치 못한 파국으로 치달았다.

|
‘트럼프 우선주의(Trump First)’와 인도의 인도-태평양 재조정 |
| 2025년 9월 15일 |
-
최윤정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yjchoi@sejong.org
-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취임과 함께, 당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인도 관계는 예기치 못한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1기에 이어 2기 출범 직후만 해도 끈끈한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와 모디 총리의 관계는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악화되어, 9월 현재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자유주의 국제질서 내에서 중국에 대한 대항마로 전략적 가치를 높여온 인도의 변화하는 외교 행보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다. 인도 국내에서는 지난 25년간 지속해 온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회의가 증폭되면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지난 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연출되었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2) 2020년 6월 히말라야 갈완 계곡에서 발생한 양국 간 유혈 충돌 이후 얼어붙었던 중–인도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3) SCO 톈진 정상회의 종료 후 발표된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다극화된 세계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암묵적으로 비판하였는데, 이는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견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4) 모디 총리는 SCO 정상회의 직후 중국을 떠났고, 이튿날인 9월 3일 북경에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최근 행보를 둘러싸고 인도가 중국과 한 배를 타려는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중국 방문에 앞서 8월 29~30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인도에 향후 68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하였고, 양국은 인공지능(AI)과 경제안보 분야 협력 이니셔티브를 새로 출범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질서의 새로운 축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천명하였다. 5) 특히 인도–일본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일방주의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동시에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도가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기류를 노출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이들과 새로운 연대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 중심도 중국 주도도 아닌 독자적인 제3의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근 인도의 전략적 방향성을 분석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악화된 미–인도 관계의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 속에 나타나는 인도의 전술적 선택과 구조적 한계를 평가하며, 인도가 추구하는 새로운 인도-태평양의 질서를 조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국제정세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모색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냉전 후 미국 외교의 대표적인 성공작이었던 미-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구축해 온 대외관계 중에서 미–인도 관계 개선은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2000년 이후 약 25년간 인도와 미국이 축적해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민주주의, 경제 발전, 안보 이해를 공유하는 두 거대 국가 간의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호주·일본·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를 정상회의로 격상시키고 인도를 대중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포섭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9월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하우디 모디(Howdy, Modi!)’ 행사에 참석해 모디를 진정한 친구(true friend)라고 부르는 등 유례없는 밀월 관계를 전세계에 과시했고, 2020년 2월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열린 ‘나마스테 트럼프(Namaste Trump)’ 행사에서도 정상 간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하며 양국 관계가 사실상의 동맹 수준에 근접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6)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시절에 확대된 인도와의 협력 기조를 이어받아 국방·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시켰다. 인도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2025년 2분기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최대 공급국이 되는 이정표를 세웠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미국이 수입한 스마트폰의 44%가 인도산으로, 중국산 비중(25%)을 크게 앞질렀으며, 이는 인도가 미·중 간 ‘탈동조화(decoupling)’ 속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인도는 미국과 군사 분야 4대 기본협정을 모두 체결하여, 미・인도 간 정보 공유와 군수 지원, 통신 및 정밀항법 데이터 교환 등에 있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협력 기반을 갖추었다. 8) 이러한 협정들을 바탕으로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며 군사력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130J 수송기 12대, C-17 전략수송기 10대, P-8I 해상초계기 12대,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22대, MH-60R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24대 등을 도입하였고, 2024년에는 MQ-9B 무인정찰기 31대 도입 계약까지 성사시켰다. 9)
경제 분야에서도 최근까지 양국 협력은 순항해왔다. 미–인도 교역 규모는 2000년 약 200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에는 2,123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10)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인도는 글로벌 IT 아웃소싱의 메카로 성장하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메타(Meta)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R&D 센터와 기술 허브를 설립하였다. 11) 이처럼 2020년대 중반까지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는 다방면 협력이 발전한 미–인도 관계는, 냉전 이후 미국 외교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될 만했다.
트럼프 2기의 우선주의(“Trump First“) 폭주가 불러온 파국
하지만 2025년 집권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5년간 양국이 쌓아온 신뢰의 탑을 단숨에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對)인도 초강경 기조를 보였는데, 무역 분야에서 관세를 지렛대로 인도를 압박하면서 양국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양국 관계 악화의 결정적 분수령이 된 것은 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Pahalgam)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와 그 후속 사태였다. 파할감 테러로 인도 민간인 26명이 사망한 이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심각한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이 사흘간의 국지전은 자칫 핵보유국 간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마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자신이 ‘중재자(mediator)’ 역할을 자임하며 사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2)
특히 6월 17일 트럼프와 모디 총리 간의 전화 통화 이후 상황은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인도–파키스탄 간의 정전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내가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고까지 발언했다. 그는 자신이 양국 간 핵전쟁도 불사했을 상황을 수습한 ‘진정한 평화중재자’라고 자화자찬하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흘리듯 언급했다. 그러자 모디 총리는 즉각 ‘정전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직접 합의한 것이지, 미국의 중재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트럼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3)
6월 18일에는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회담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모디 총리가 트럼프의 백악관 초청 제안을 거절한 직후 이루어진 일이었다. 트럼프 가문 관련 기업이 파키스탄 정부 산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트럼프의 공정성에 대한 인도 내 의심은 더욱 커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6월 21일 공식적으로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14)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30차례 넘게 자신이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해결했다고 자랑했지만,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그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15) 파키스탄과의 분쟁에 있어 외부의 개입을 터부시하는 인도 국내 정치 특성상, 트럼프의 행보는 인도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인도 국방장관 라지나트 싱은 7월 27일 의회 연설에서 “인도는 어떤 외부 세력의 중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비난했다. 16)
이런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인도를 향해 등 돌린 태도를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인도 경제를 모욕하며 “죽은 경제(dead economy)”라고 부르는가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인도가 러시아에 자금을 대준다는 식의 비난까지 쏟아부었다. 급기야 7월 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인도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고, 불과 몇 시간 뒤에는 파키스탄산 제품에는 19%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는 일주일 만에 더욱 악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며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았는데, 8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인도산 수입품에 기존 25%에 더해 25%포인트를 추가한 총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17) 이는 미국이 현재 부과 중인 국가별 관세율 가운데 최고 수준의 관세 폭탄으로, 브라질에 대한 50%, 시리아 41%, 라오스·미얀마 40% 등과 함께 인도가 최대 타겟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2025년 중반부터 가시화된 미–인도 관계의 급변은 몇 가지 요인으로 요약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려는 ‘트럼프 우선주의(Trump First)’와 즉흥적 정책 스타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맹과 파트너십보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앞세웠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파키스탄과의 갈등 중재 과정에서 드러난 노벨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신을 치켜세워주지 않는 인도에 대한 원망이 정책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18) 둘째, 전략적 계산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 밀착을 미국의 글로벌 대전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원유를 수입하고, 일부 인도 기업들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트럼프는 이를 빌미로 인도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 내부 강경파들의 영향력 증대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의 경우 그간 인도의 높은 관세와 시장 폐쇄성을 불만으로 품어왔는데, 트럼프와 인도 간 균열이 커지자 이러한 대(對)인도 불만 세력이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 19)
결국 이러한 파국적 상황까지 초래한 트럼프식 외교의 후폭풍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20) 크고 다양하며 복잡한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국내 정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조치였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간 과거 미 행정부가 오랜 시간 끈기 있고 인내심 있는 외교를 통해 인도를 점진적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양국의 이익과 행동이 동조하도록 만들어온 공을 트럼프 2기가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미 가해진 손상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오는 가운데, 인도 내부에서는 미국이 결국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평소 친구라고 부르던 상대에게도 가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1)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태도를 바꿔 관계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인도인들은 이미 미국의 민낯을 보았다는 것이다. 22) 인도는 당분간 대미 불신 여론을 배경으로 대외전략 전반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과의 전술적 화해: 구조적 한계 속의 현실적 선택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하반기 나타난 인도와 중국 간 화해 무드는 인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적 접근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일단 인도와 중국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9월 1일 중국 톈진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시진핑–모디 회담은 2020년 갈완 계곡 유혈 충돌 이후 양국 정상 간 최장시간 대화(약 45분)였다. 회담 후 양국은 국경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합의하고 실무 차원 협력 확대를 약속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모디 총리도 SCO 전체회의 연설에서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며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3) 표면적으로는 5년여간 얼어붙었던 중–인도 관계의 해빙이 시작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사이 구조적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3,488km에 달하는 길이의 국경분쟁이다. 2020년 6월 15일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 발생한 양국 국경수비대 충돌은 45년 만에 인도·중국 간 수십 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낳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양측은 실질통제선(LAC) 일대에 각각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전진 배치하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지속되어왔다. 2024년 10월 양국은 갈완 지역 부대 철수에 합의하며 일부 완화 조짐을 보였으나, 이는 전체 분쟁 지역의 3% 미만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 전체(약 8만3천㎢)를 자국 영토인 ‘장난(藏南, Zangnan)’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24)
경제적 갈등도 중–인도 관계의 뇌관이다. 2024년 인도의 대중 무역적자는 99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인도 전체 무역적자의 37%를 차지한다. 25) 인도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382건의 반덤핑 관세와 3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며 수입 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방대한 중국제 소비재·중간재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인도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산 수입을 줄이고 대미 수출을 늘리는 탈중국 전략을 취하자, 중국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인도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과 미국과의 경제 밀월을 견제하며, 인도가 지나치게 서구 편향적 노선을 탈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중–인도 관계는 겉으로는 실용적 협력이 부각되지만 이면에는 불신과 경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따라서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양국 관계는 적대적 협력(adversarial cooperation)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후변화 대응, 브릭스(BRICS)·G20 등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일부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협력하되, 국경 문제와 인도양 해양 영향력 경쟁,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 주도권 다툼 등 핵심 안보 이슈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대립을 지속하는 양면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제한적 협력을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도는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중국의 자본재와 기술이 여전히 필요하고, 중국에게 거대 인도 시장과 값싼 노동력의 매력도 크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녹색전환 산업 분야에서는 상호 보완성이 두드러져, 일부 합작 투자나 기술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인도 현지 공장 증설을 모색하고 있고, 인도 타타그룹은 중국의 배터리 기술을 도입하는 등 실리적 협력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러나 핵심기술 영역에서는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인도는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역량을 키우려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인도의 IT 서비스·SW 인재를 활용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도 부상을 경계하고 있다.
지정학 측면에서도 인도양에서의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에 맞서 인도는 스리랑카, 몰디브, 세이셸,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에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정세 불안 역시 양국 간 외교 각축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 결국 인도와 중국은 당분간 현실적 필요에 따라 가까워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도, 근본적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제한적 협력과 구조적 경쟁을 병행하는 복잡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특별한 관계: 70년 우정의 지속과 전략적 거리 두기
인도 외교 전략의 기본에는 언제나 위험 분산(risk hedging)이 자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밀착 유지 및 중국과의 부분적 화해는 이러한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인도-러시아와의 관계는 중국과는 전혀 다르다. 인도에게 러시아는 그 어떤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다. 1950년대 서방 진영이 인도에 대한 무기 공급을 거부했을 때 소련이 최초로 인도에 무기를 제공한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군사협력은 오늘날 인도 국방력의 근간을 이룬다. 현재도 인도군 보유 장비의 60~70%가 러시아산일 정도로 군사 의존도가 높다. T-90 전차, Su-30MKI 전투기, INS 비크라마디티야 항공모함,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인도 핵심 전력은 대부분 러시아와의 공동개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26) 특히 S-400 트리움프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은 인도–러시아 군사협력의 상징적 사례다. 현재 인도군은 3개 대대의 S-400을 운용 중인데, 이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파키스탄 F-16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어 인도 방공망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27)
에너지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인도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다. 2025년 현재 인도는 석유 수입량의 36~40%를 러시아산 원유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의 2% 미만에서 폭증한 것이다. 인도의 대형 정유회사들(인디언오일, 릴라이언스, 나야라에너지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시장에서 러시아산 우랄(Ural) 원유를 배럴당 8~12달러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해 왔다. 이를 통해 인도는 총 126억 달러의 원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 냉전 시절처럼 인도가 러시아에 밀착한 외교 노선을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도는 이미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국력 약화를 인지하고 국익 차원의 거리 두기도 병행해왔다. 28) 러시아가 과거 소련 시절만큼의 역량이나 글로벌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러시아가 중국 및 파키스탄과 밀착하여 반서방 연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인도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러시아 주도로 진행 중인 SCO의 확대 과정에서 북한의 정회원 가입 추진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에도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인도는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북한의 핵개발 및 한반도 불안정은 인도의 핵비확산 원칙과 동아시아 전략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는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러–중–파 연대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전략적 제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중심축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중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은 일정 순서에서 어느 정도 인도의 전략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인도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8월 28일 도쿄에서 열린 제15차 인도–일본 연례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이러한 구상을 명확히 드러낸다. 양국 정상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일방주의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모두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 측의 680억 달러 대인도 투자 계획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 성격을 띠고 있다. 양국은 반도체, 양자컴퓨팅, 우주기술, 사이버보안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중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기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협력에서 양국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는 현재 글로벌 AI 협의체인 GPAI(Global Partnership on AI)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의 AI 거버넌스 주도권 확보를 꾀하고 있다. 인도는 GPAI 참여국을 현재 29개국에서 6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구 선진국 주도의 AI 규범 형성에 개도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9)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인도–일본 AI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국제 표준의 공동 개발이다. 양국은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편향성 제거 등 윤리적 AI 원칙에서 미국 빅테크나 중국의 접근과 차별화된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성 있는 AI 규범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제3의 AI 진영 형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인도가 미국 이외에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안보, 경제, 기술 각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중심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인도 입장에서 일본과의 연대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며, 일본 역시 인도와 협력함으로써 중국 및 북한에 대한 견제력을 높이는 한편 경제안보 측면에서 공급망 다변화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인도–일본 간 전략적 제휴의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중견국 연대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미국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나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인도 외교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인도의 선택이 향후 국제질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욕적 언사와 일방적 조치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 인도 여론은 한때 반미 감정으로 결집된 모습까지 보였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강한 인도에서 모디 총리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국내에서 비교적 수월히 받아들여진 것도, 아이러니하게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외교가 가져온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인도는 11월 개최 예정인 쿼드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안보 의제를 이전보다 비중 있게 다룰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간 관계가 냉랭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하면서 쿼드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이에 정상회의 개최 전망까지도 의문시되면서, 인도는 정치·외교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인도가 중국·러시아와 연대하여 ‘미국이 배제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나설 시나리오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인도 스스로도 그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앞서 상세히 살펴본 중–인도 간 구조적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국경분쟁, 인도양 영향력 경쟁, 파키스탄을 둘러싼 대립, 무역 불균형 등의 현안은 겉으로 봉합되더라도 언제든 재분출할 수 있다. 9월 SCO 톈진 회의에서 모디와 시진핑의 환한 웃음은 단순히 외교적인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 인도가 안보 주권과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완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둘째,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옅어지고 있다. 냉전 시절 인도의 맹방이었던 소련의 붕괴 이후, 인도는 러시아가 더 이상 과거의 초강대국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국제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더욱이 러시아가 중국, 심지어 파키스탄과 연대하여 반미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인도 국익과 상충한다. 인도가 추구하는 다극질서는 어디까지나 인도를 하나의 극(pole)으로 상정하지만, 러시아–중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인도의 입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SCO에서 북한의 정회원국 가입 문제가 거론되고,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의 ‘약소 파트너’로 전락하는 모습은 인도에게 경고신호다. 인도는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그것이 탈서방 신냉전 동맹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할 것이다.
셋째, 인도는 일관되게 다극화된 국제체제(multipolar world)를 옹호해왔다. 인도가 원하는 것은 미국 일극 지배체제도, 중국 주도의 지역패권도 아닌, 여러 강대국과 중견국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질서다.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단일 패권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도의 지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인도는 기존 질서를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 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고 개혁하는 데 기여하는 건설적 세력을 자처하고 있다. 30) 따라서 인도가 중국·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은 향후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는 신냉전 구도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도가 어느 일방의 진영에 깊숙이 편입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을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 인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톈진 SCO 회의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맞서는 반서방 연대를 천명했으나, 인도는 이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다극화 원칙만 강조했다. 신냉전의 전면화를 막는 데 있어 인도의 역할이 오히려 건설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여기에 기반한다.
트럼프 2기의 돌출적 행동으로 인도 외교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미국 없는 세계질서’나 새로운 냉전 블록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도가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도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중국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자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중요한 외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미–중 사이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은 기존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유연성과 다원성을 부여하며, 한국도 이러한 인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신북방정책 연계 및 AI 공동전선 등 새로운 기회 모색
최근 인도의 전략적 재조정은 한국에게 새로운 외교·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신냉전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주도의 지역질서 부상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신냉전 구도를 저지하고 다극질서를 지향하는 인도의 입장에 공감대를 갖고 외교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인도 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서로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와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양국 모두 무역과 기술 파트너의 다각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가시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경제분야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한–인도 CEPA(2010 발효)는 상품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연 146억 달러 규모)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랫동안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CEPA를 아예 신세대 무역협정으로 격상시켜, AI·바이오·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챕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배터리, 그린수소,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는 광대한 내수시장과 인력풀을 갖추고 있어, 양국이 미래첨단 산업에서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경제적 이익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조선·방위산업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망할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해양 안보와 국방력 증강을 위해 대규모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연간 130~150억 달러 규모)으로 방산 수요가 막대하다. 한국과 인도는 이미 조선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2017년 양국 정부는 해군 함정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후 현대중공업(HD현대)과 인도 코친조선소 간 기술협력, 한화오션의 인도 잠수함 사업 참여 등이 진전되었다. 이 협력을 보다 심화하여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 등 첨단 해군전력 건조에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생산기지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의 3천 톤급 잠수함(KSS-III)이나 차기 구축함(FFX) 기술은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국방현지화 정책과도 부합하여 인도 측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방산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인도는 대러시아·대서방 군사 의존도를 다변화하며 해양력 증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첨단기술 거버넌스 측면에서 AI 공동전선 구축을 추진해볼 만하다. 인도가 일본과 함께 미국·중국과 차별화된 AI 질서를 구축하려는 현 시점은 한국에도 기회가 된다. 한국은 AI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5G/6G 통신, 로봇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역량과 방대한 데이터 시장이 강점이다. 양국이 협력한다면 신뢰성 있고 투명한 AI 기술 표준을 함께 개발하고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방갈로르 AI 이니셔티브 등을 출범시켜 공동 연구센터 설립, AI 연구인력 교류, 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가 중국 주도의 AI 질서에 대응하여 개도국 연대를 형성하려는 지금이 한–인도 AI 협력의 최적기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반도 문제에서 인도의 역할이다. 인도는 북한과 1973년 수교 이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핵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규범을 지지해왔다. 인도는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 당시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했다. 현재 러시아가 SCO를 통해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 속에서, 31) 인도가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인도는 북한에 비교적 중립적 채널을 갖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대화 국면에서 중재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공석이었던 평양 주재 인도 대사를 곧 재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과거에는 주로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도와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앞으로는 인도를 신북방정책의 연장선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인도–러시아 3자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거나, 대북 경제협력 구상에 인도를 참여시켜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인도의 독자적 외교 네트워크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우회적으로 활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향후 한–인도 정상간 교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25년 9월 말 유엔 총회, 10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말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만남을 2026년 초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으로 연결하여 양국 관계 격상의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방문 시기로는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2026년 1월 26일 인도 공화국의 날(Republic Day) 기념식 주빈(Chief Guest) 참석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공화국의 날 주빈으로 초청된 바 있어 선례가 있다. 둘째는 인도 정부가 2026년 초 개최할 예정인 글로벌 AI 정상회의 참석이다. 후자가 성사된다면, 한–인도 정상은 AI 공동협력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시키고 서울–방갈로르 간 공동 AI 연구센터 설립, AI 거버넌스 국제표준 공동개발, 스타트업 인재 교류 등 구체 의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이 인도의 신흥 기술질서 구상에 동참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AI 규범에 대응하는 한편, 인도와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도라는 전략적 카드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한국 외교에 갈수록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인도를 비롯한 중견국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기존 강대국 중심 국제질서에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21세기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곡점에서, 한국과 인도가 협력하여 다극화와 포용적 거버넌스를 추구한다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극단적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등장은 단기적으로 미–인도 관계 균열을 초래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에게는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및 전략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도와 함께 지역과 세계의 평화·번영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들어가는 말
1) CNBC, “India’s nearly $87 billion exports to U.S. under threat due to Trump tariffs”, August 7, 2025.
2) Eduardo Baptista, “China’s Xi met Putin and Modi, as Trump’s shadow loomed”, Reuters, August 31, 2025.
3) Sputnik News India, “Modi’s China Visit: RIC Triangle Key to Multipolar World Order”, September 1, 2025.
4)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Tianjin Declaration of the 2025 SCO Summit,” September 1, 2025,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40076.
5)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15th India-Japan Annual Summit Joint Statement: Partnership for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Next Generation," August 29, 2025,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F40062.
| 미-인도 관계: 25년 신뢰의 탑이 무너진 이유
6) Rezaul H. Laskar, “From ‘Howdy Modi’ to 50% tariffs: How Trump-Modi bromance turned sour”, Hindustan Times, August 10, 2025.
7) Ian Hall, “Donald Trump was once India’s best friend. How did it all go wrong?”, The Conversation, September 2, 2025.
8) 구체적으로 인도는 2002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016년 군수지원협정(LEMOA), 2018년 통신호환 및 보안협정(COMCASA), 2020년 기본교류협력협정(BECA)를 차례로 체결하였다.
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 “India–U.S.: Major Arms Transfers and Military Exercises,” Report IF12438, May. https://sgp.fas.org/crs/row/IF12438.pdf.
10)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India,” last modified July 31, 2025, https://ustr.gov/countries-regions/south-central-asia/india..
11) Jyoti Shankar, “U.S. and India to boost bilateral trade to $500 billion by 2030, Modi says”, CNBC, February 14, 2025.
12) Al Jazeera, “India-Pakistan border clash leaves six soldiers dead”, May 15, 2025; Mujib Mashal, “Trump Claims He Prevented World War III Between India and Pakistan”, The New York Times, June 18, 2025.
13) Reuters. 2025. “Trump hosts Pakistani army chief, disagrees with India over India-Pakistan war mediation.” June 19.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ndia-will-not-accept-third-party-mediation-relations-with-pakistan-modi-tells-2025-06-18.
14) Reuters, “Pakistan to nominate Trump for Nobel Peace Prize”, June 21, 2025
15) TRT World. 2025. “India’s Modi denies Trump brokered peace with Pakistan.” July 29. https://trt.global/world/article/0e522908cdb2.
16) Rajnath Singh. 2025. “No Foreign Pressure Behind Operation Sindoor Halt: Rajnath Singh.” Lok Sabha Speech, July 27. DD News. https://ddnews.gov.in/en/no-foreign-pressure-behind-operation-sindoor-halt-rajnath-singh.
17)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ugust 6, 2025, Presidential Action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8/addressing-threats-to-the-united-states-by-the-government-of-the-russian-federation/
18) Mujib Mashal & Suhasini Raj, “How Trump’s Nobel Prize Obsession Poisoned U.S.-India Relations”, The New York Times, August 30, 2025.
19) Peter Navarro. 2025. “India’s Oil Lobby Is Funding Putin’s War Machine — That Has to Stop: Its Dependence on Russian Crude Undermines the Effort to Isolate Moscow,” Financial Times. August 18, 2025.
20) Kurt M. Campbell and Jake Sullivan, “The Case for a U.S. Alliance With India: Washington Should Draw New Delhi Closer, Not Push It Away,” Foreign Affairs, September 4, 2025,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india-alliance-jake-sullivan-kurt-campbell; Alex Zerden and Tamanna Salikuddin,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s a Strategic Reset with India,” Atlantic Council, July 22, 2025,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the-trump-administration-needs-a-strategic-reset-with-india.
21) Happymon Jacob, "The Shocking Rift Betwee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Can Progress in the Partnership Survive Trump?," Foreign Affairs, August 14, 2025, https://www.foreignaffairs.com/india/shocking-rift-between-india-and-united-states.
22) Kumar, Manoj, and Nidhi Verma. “Why India Is Pivoting Away from U.S. after Biting Trump Tariffs; Wary Officials See Pressing Trade Problems, Better Options Elsewhere.” Reuters, September 2, 2025. https://www.reuters.com/world/india/why-india-is-pivoting-away-us-after-biting-trump-tariffs-2025-09-02/.
| 다시 복잡해진 인도의 계산
23)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 “PM Modi’s Remarks at 2025 SCO Summit (Tianjin)”, September 1, 2025
24) Reuters. 2025. “India Rejects China’s Latest Renaming of Places in Arunachal Border State.” May 14.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ndia-rejects-chinas-latest-renaming-places-arunachal-border-state-2025-05-14/.
25) KNN India. 2025. “India–China Trade Deficit at USD 99.2 Bn, USD 161 Bn Export Potential Untapped: ICRIER Study.” August 29. https://knnindia.co.in/news/newsdetails/global/indiachina-trade-deficit-at-usd-992-bn-usd-161-bn-export-potential-untapped-icrier-study
26) Dolbaia, Tina, Vasabjit Banerjee, and Amanda Southfield. “Guns and Oil: Continuity and Change in Russia–India Relation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August 22, 2025. https://www.csis.org/analysis/guns-and-oil-continuity-and-change-russia-india-relations
27) IDRW.org, “India Set to Bolster Air Defense with S-400 Deliveries; Fourth Regiment Expected by Q4 2025, Fifth by August 2026,” May 15, 2025, 실제로 2025년 5월 파할감 테러 이후 인도가 수행한 ‘신두르 작전(Operation Sindoor)’에서 인도의 S-400 체계는 북부 기지에 발사된 파키스탄의 무인기 및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첫 실전 사용 사례를 남겼다.https://idrw.org/india-bolsters-air-defense-with-s-400-deliveries-fourth-regiment-expected-by-q4-2025-fifth-by-august-2026/.
28)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Russia and India: A New Chapter," September 19, 2022,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2/09/russia-and-india-a-new-chapter?lang=en.; ORF America. "The Decline of India-Russia Strategic Relations," Background Paper No. 28, January 5, 2025, https://orfamerica.org/newresearch/india-russia-strategic-relations.
29) The Economic Times. 2025. “India’s Bid to Make GPAI as AI Regulator Gets Global Support.” June 25. https://economictimes.com/tech/technology/indias-bid-to-make-gpai-as-ai-regulator-gets-global-support/articleshow/111439030.cms.
| 평가 및 시사점
30) 인도는 미국 일극 패권체제도, 중국이 주도하는 일극 아시아 질서도 아닌, 여러 강대국이 공존하며 서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다극적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4년 뮌헨안보회의(MSC) 보고서는 인도를 ‘현상 유지 세력(status-quo power)’도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도 아닌 독자적·건설적 참여자(participatory power)로 분류하며, 인도가 기존 질서를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점진적 개선을 모색한다고 분석했다(Munich Security Conference. 2024. Munich Security Report 2025: “India: Modi-fied Status.” Munich Security Conference, August 30. https://securityconference.org/publikationen/munich-security-report-2025/india/).
31) Umut Uras, “Iran, North Korea seek full SCO membership amid anti-Western sentiment”, Al Jazeera, September 1, 2025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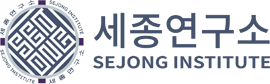
 파일명
파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