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략 태세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호주의 전략적 재조정이다.

|
호주의 전략적 재조정과 한-호 협력:방산·조선을 넘어 메타외교까지 |
| 2025년 9월 29일 |
-
최윤정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yjchoi@sejong.org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략 태세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호주의 전략적 재조정이다.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의 반대편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온 호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지향적(transactional) 외교에 직면하여 전략전 재검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AUKUS 이행이 미 국방부의 장기 검토와 의회-행정부 간 논쟁으로 지연되면서, 호주의 국방 및 방산 계획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호주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무역흑자를 내는 드문 파트너지만 트럼프 2기의 10% 기본관세 및 50% 철강·알루미늄 관세, 최근의 의약품 100% 관세 부과와 소액통관 면제 종료 등 관세 직격탄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올해 Lowy Institute가 실시한 호주 국민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으로 신뢰하는 비율은 36%로 전년 대비 20%p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1)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호주 정부도 분주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5년 9월 14일, 호주 국방부는 서호주 헨더슨 국방단지(Henderson Defence Precinct) 현대화를 위해 120억 호주달러(약 11조 원)를 투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AUKUS 이행과 국방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이자, 2) 2024년 말 발표한 ‘연속적 해군 조선·유지정비(Continuous Naval Shipbuilding and Sustainment)’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3) 나아가 호주는 아세안과의 해양협력 확대, 태평양 도서국과의 외교관계 심화, 일본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을 통해 ‘미국만이 유일한 축이 아닌’ 협력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고 있다. 2025년 7월 10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군사 역량이 외교를 뒷받침하되, 강요가 아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견국의 자주국방과 다자적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글은 트럼프 2기 호주 통상·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호주의 대응 전략을 평가하고, 한국의 대호주 정책과 외교 모델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호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서 비교적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배경에는 미국과 호주 간의 특수한 무역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호주의 대미 수출은 238억 달러, 수입은 506억 달러로 269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가 ‘불공정 무역’의 근거로 삼는 미국의 무역적자와는 정반대 구조다. 호주는 미국에 육류‧육제품(61억 달러), 비화폐용 금(29억 달러) 등 1차 산품과 의약품(21억 달러)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는 도로 차량(58억 달러), 전기기계·기기(39억 달러), 기타 운송장비(차량 제외) 및 특수기계(각 38억 달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4)
2025년 초 비화폐용 금 수출 급증으로 일시적인 대미 흑자가 관측되었으나, 이는 안전자산 선호가 야기한 일시적 변동으로 구조적 변화는 아니었다.
2020년부터 호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중 경제안보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과는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호주는 이미 2024년 미–호 핵심광물작업반, 사이버위협분석 MOU, 민간우주 협력(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호주는 공급망 안정과 핵심광물 안보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재조정 중이다. 2025년 4월 발효된 AANZFTA(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업그레이드와 IPEF 공급망 협정에도 주도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역내 규범 현대화와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협정(CECA)은 농축산·주류 분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 인력 이동성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12억 호주달러 규모의 전략적 비축, 2025년판 투자 유치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자원 기반의 경제안보를 제도화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아와 유럽에 더 많은 통상사절단을 보내고, 녹색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와 수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중 관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안보적 경계심은 유지하되 무역관계는 복원하는 ‘관리된 해빙'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20년 호주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촉구 이후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보리, 석탄, 와인 등에 대한 수입 제재를 확대했으나, 2024년부터 와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호주산 소고기 수입도 재개하는 등 통상장벽을 다시 낮추고 있다. 2024년 호주 수출(6,444억 호주달러)의 30.4%가 대중국 수출(1,960억 호주달러)로, 호주가 기록한 302억 호주달러의 무역흑자는 주로 대중국 무역흑자(804억 호주달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철광석(2024년 1,486억 호주달러)은 중국 철광석 수입의 약 6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호주가 대중 정책에서 실용적 접근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호주 정부가 2021년 미국, 영국과 함께 발표한 AUKUS는 호주 역사를 통틀어 최대 투자일 뿐만 아니라 규모와 함의 측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5)
AUKUS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세적 팽창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 강화와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구축된 삼자 안보·산업 협력체다.
AUKUS의 핵심 구조는 두 개의 기둥(Pillar)으로 구성된다. Pillar I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 지원이 핵심이다. 미‧영의 핵잠수함(SSN) 방문‧순환배치에서 시작하여, 호주가 핵잠수함을 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레디(sovereign ready) 단계에 도달하면 버지니아급 3~5척을 순차 도입하고, 영‧호 공동 건조 핵잠수함(SSN-AUKUS)을 건조하는 단계적 로드맵으로 구성된다. Pillar II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극초음속 무기, 무인체계 등 첨단 군사기술을 삼국이 공동 개발하여 기술 장벽을 낮추고 상호운용성을 증대하는 협력 체계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검토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호주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 투자에 착수했다. 2025년 9월 14일에 발표된 서호주 헨더슨 조선소 현대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 호주달러(약 23조 원) 규모로 진행할 헨더슨 국방단지 조성 사업의 선급금으로 120억 호주달러(약 11조 원)를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헨더슨 국방단지는 단순한 조선소를 넘어 포괄적 해군력의 허브로 설계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유지·보수는 물론 수상함 건조, 상륙정 제작, 해군 장비 정비까지 담당하며, 약 1만 개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헨더슨 국방단지 조성은 호주 국방 생태계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에는 동부 시드니와 애들레이드에 집중되어 있던 조선업이 서호주로 확산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대아시아 진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헨더슨은 AUKUS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및 영국 군함도 이 시설을 공동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호주는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해양 안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AUKUS 이행을 재검토하고 있으나, 6) 2025년 7월 호주와 영국 간 50년 잠수함 파트너십(질롱 조약)은 협력의 제도화를 진전시켰다. 7) 트럼프 2기에서 AUKUS 잠수함 협정의 위험 요인과 이행 변동성은 상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산업·정비 인프라를 미리 확충하는 ‘허브 전략’은 억지의 내구성을 높이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수중전 환경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양자센서와 AI 기반 탐지기술의 발전으로 이른바 ‘투명한 바다’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호주는 SSN 전력 확보를 핵심 축으로 유지하되, 무인잠수함(UUV) 전개, 대잠전(ASW) 능력 강화, 해저케이블 등 수중 인프라 보호를 결합한 다층 억지 포트폴리오를 병행할 필요가 커졌다. 이는 헨더슨과 HMAS 스털링이 수행할 정비‧훈련‧시험평가 기능을 잠수함 중심에서 다영역 수중전 생태계로 확장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 같은 전환은 호주 국방부가 2024년 국방전략검토에서 제시한 ‘통합 집중 전력(Integrated Focused Force)’의 논리와도 합치한다. 8) 육‧해‧공‧우주‧사이버의 통합 운용을 전제로, 플랫폼(SSN)과 체계(UUV‧센서‧네트워크), 인프라(MRO‧기지), 규범(안전‧규제)을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조정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2025년 5월 재집권한 알바니지 정부가 이 개념을 한층 강화해 보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국방체계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변동성 높은 동맹 환경과 기술 변화에 구조적으로 적응하려는 전략적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미 호주는 미국과의 양자 동맹 외에도 다양한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쿼드(Quad)가 기후변화, 백신 공급, 기술협력 등 비전통 안보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호주는 일본, 미국과의 삼자안보대화(Trilateral Security Dialogue, TSD)를 통해 전통적 국방·안보에 특화된 협력을 보완하고 있다. 2002년 출범한 TSD는 쿼드보다 더 오랜 역사와 조직적 협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08년 쿼드가 와해되었을 때도 건재했던 생명력을 입증했다. 육·해·공군의 상호운용성 증대를 위한 Southern Jackaroo 훈련(5월), 남중국해 훈련(3월), Exercise Cope North(2월) 등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TSD는 인도·태평양의 3대 분쟁위험지역(대만해협, 한반도, 태평양)에서 3군의 즉각 개입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호주의 지역 안보 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동남아 협력의 심화다. 호주는 2024년 11월 '미래를 위한 국방 파트너십(Defence Partnership for the Future)' 성명에서 동남아 국방 관여 프로그램 신설, 장학 프로그램 확대, 해양안보 연구 연장, 심포지엄 연례화를 제시했으며, 2028년까지 6,400만 달러 규모의 해양 파트너십 투자로 해양법 집행, 해양영역인식,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해양보호 및 보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동남아 지역에 12.8억 호주달러의 개발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호주가 ‘제도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책임있는 중견국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역내 관여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호주가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의 충격파를 흡수할 1차 방어선을 동남아에서 구축하려는 전략적 계산과 함께 AUKUS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AUKUS 협정 발표 이후 지역 군비 경쟁 심화, 남중국해 긴장 고조 가능성을 우려하며, 핵추진 잠수함의 동남아 해역 통과가 비핵지대(SEANWFZ) 및 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2025년 9월 10~11일 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연달아 방문해 AUKUS가 지역 안정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9차 호주-인도네시아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에서는 합동 군사훈련 확대, 상호운용성 증진, 해양 및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방문 시 열린 ASEAN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집단적 지역 안정 책임과 ASEAN 중심성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필리핀과의 연합훈련 확대, 기지 접근 및 순환 배치 협정 추진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현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8~9월 실시된 호주-필리핀-캐나다 삼자 해상훈련에는 미 해병대까지 참여하며 다자 협력과 협력 범위 확대를 보여주었다. -
이러한 지역 방어선 구축의 개념 하에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에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 관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2023년 11월 체결된 호주-투발루 ‘팔레필리 연합(Falepili Union)’ 협정을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기후변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투발루 국민 매년 최대 280명에게 호주 이민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간 기후 이주 특별 비자 조약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팔레필리 연합은 기후 협력을 넘어 안보적 함의를 갖는다. 조약 4조는 투바루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사안에서 다른 국가나 기관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호주와 상호 합의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호주가 투바루 안보정책에 관여하는 기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호주가 투바루를 발판 삼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호주는 2024~25년 투바루에 5,700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최초의 해저 통신케이블 건설, 신탁기금 증액, 항공 안전 및 연결성 강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경제, 안보, 인도적 지원을 통합한 패키지 접근법은 호주 지역 전략에서 부각되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태평양 도서국에서 투바루 모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푸아뉴기니(PNG)와의 관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당초 추진되던 상호방위조약(MDT)은 PNG 내각의 정족수 문제로 일단 유보되었지만, 대신 방위공동성명으로 대체됐다. PNG 측이 중국의 영향설을 부인했지만, 호주의 '태평양 파트너십' 외교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호주는 태평양 해양안보 프로그램(Pacific Maritime Security Program, PMSP)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항공 감시 관련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고, PMSP는 고정익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를 통한 태평양 국가들의 해양안보 지원을 3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호주의 창의적 지역 관여 전략 중 하나로 스포츠 외교의 활용도 주목된다. PNG와는 럭비리그, 축구 중심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인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평양 도서국들과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하드파워를 보완하는 소프트파워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은 경제-안보-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호주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다. -
방산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은 이미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확대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진출이 대표적 사례로, 2023년 12월 호주 정부와 체결한 레드백 장갑차 본계약(129대, 3조 2,000억원)은 한국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거점 구축으로 평가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현지화 전략의 심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펜스케(Penske Australia)와 레드백 엔진 조립·테스트·공급 계약을 맺고,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AS9 헌츠맨을 빅토리아주 질롱시 H-ACE(Hanwha Armored vehicle Center of Excellency)에서 생산하며, 호주 기업 TEi 서비스와의 수천만 달러 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통해 현지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9)
반면 한화가 호주 방산조선업체 오스탈(Austal) 인수 제안이 거부된 것은 방산 협력이 넘어야 할 한계를 보여준다. 미국 해군에 주력 군함과 상업용 선박을 설계·건조해 납품하는 방산기업인 오스탈 인수를 위해서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미국 국방정보국 등 미국과 호주 안보 관련 규제 기관들의 승인이 필요했다. 미국 CFIUS는 2025년 6월 한화의 지분 인수를 승인했으나, 호주 FIRB는 국가안보와 산업 주권 관점에서 여전히 신중한 심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방산 분야 확장을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와의 신뢰 구축과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헨더슨 국방단지와 AUKUS 협력 기회
헨더슨 국방단지 조성은 한국 조선·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향후 15년간 핵잠수함 도입과 함께 수상전투함, 상륙함, 지원함 등 다양한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다. 10) 한국의 KSS-III급 잠수함 및 차세대 구축함(FFX, KDDX) 기술은 호주의 ‘메이크 인 오스트레일리아(Make in Australia)’ 방산 현지화 정책과 부합하여 상당한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 11) 한국과 호주 모두 연속 조선(continuous shipbuilding)과 해상 교통로 방어를 우선시하고 있어 양자 해군간 상호운용성 작업반 설립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2)
보다 구체적으로 AUKUS 관련 협력의 기회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AUKUS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호주는 버지니아급에서 SSN-AUKUS로 이어지는 핵잠수함 체제에 장기간 전념하게 되며, 헨더슨 국방단지를 중심으로 한 MRO(정비) 허브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직접적인 핵잠수함 기술 협력 여지는 제한적이지만, 수상전력, 무인잠수함(UUV), 대잠전, 센서 기술, 정비 및 훈련 등 보완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헨더슨 MRO 허브의 일부를 한-호 분업 구조로 설계하여 한국의 조선·방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9월 27일 앨버니지 총리가 영국 총리 스타머와 회동 후 "AUKUS 지속에 자신한다"고 발언한 것은 미국의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영국-호주 양측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시켜주며, 이러한 지속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AUKUS가 일정 지연이나 축소로 좌초되는 경우에도 호주의 자주국방 강화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므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안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AUKUS Pillar II의 첨단 기술 협력(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극초음속, UUV) 프로젝트 단위 협력을 선도하고, 호주의 방산업체 자격 인증 제도(DIVQ)와 산업 역량 네트워크(ICN)를 활용한 현지 법인 설립이나 합작투자를 통해 호주 방산 공급망에 직접 진입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13) 또한 이 경우 한국의 KSS-III급 잠수함 기술과 차세대 구축함 기술이 호주의 대안적 해군력 건설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광물과 제도적 협력 기반
핵심광물 협력은 정부-민간-금융 삼각축을 중심으로 구체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가 2025년 5월 호주 퍼스에 ‘호주 핵심광물 연구소’를 개소해 한국 기업 최초로 현지 자원 연구소를 설립했고, 호주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와 MOU를 맺어 탄소저감 제철, 리튬 정제, 희토류 추출 기술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수출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미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간의 리튬 프로젝트 공동지원 등 금융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들의 호주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고, 배터리 밸류체인에서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대화의 틀을 확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호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는 2024년 제6차 회의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CSP) 심화를 확인했다. 양국은 공동 인프라, 탈탄소, 공급망, 핵심광물, 동남아 협력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향후 이러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호접근협정(RAA)이나 방위기술협력협정(DTCA)급 제도 설립을 검토할 시점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선·방산 협력을 가로막는 제도적 간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역 다자협력과 메타외교 모델
동남아와 남태평양에서 한국-호주-아세안 및 한국-호주-도서국 소다자 협력의 포맷을 상설화하여, 개별 프로젝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쇄 협력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 호주가 아세안과 맺은 10년간의 대표 협력 프로그램인 Aus4ASEAN Futures(호주-아세안 미래 협력 이니셔티브)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호주가 경제, 안보·국방, 스포츠와 문화의 힘을 통합한 창의적 지역 관여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팔레필리 연합은 기후변화 대응, 안보협력, 인도적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투바루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파푸아뉴기니와의 스포츠 외교, 아세안과의 해양 협력도 유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국도 창의적이고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안보·산업·통상·기술·규범·문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whole-of-government/whole-of-nation) 다층적인 네트워크(정부–산업–학계–동맹·파트너) 안에서 한국의 국력과 대외 위상을 높이는 통합형 외교전략을 “메타외교”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전략 환경을 평가하고, 한국이 표방해야 할 상위 외교 개념이자 포괄적 실행 틀이다.
그리고 이 메타외교 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무대가 곧 다가온다. 한국으로서는 금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경제·안보·기술·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외교 총력전을 펼칠 기회다. 방산·조선 등 핵심 안보협력 분야에서 신뢰 기반의 제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규범적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남은 시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들어가는 말
| 관세전쟁에 휘말린 호주
| AUKUS와 자주국방 강화: 120억 호주달러 선투자의 의미
| 미국을 넘어선 안보협력: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
| 창의적 지역 관여: 태평양 도서국과의 새로운 모델
| 평가 및 시사점: 방산·조선협력을 넘어 새로운 “메타외교”로
1) Lowy Institute, Lowy Institute Poll 2025 (Sydney: Lowy Institute, June 22, 2025), accessed September 10, 2025, https://poll.lowyinstitute.org/files/lowyinsitutepoll-2025.pdf.
2)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Additional Defence funding to deliver the Henderson Defence Precinct,” Media Release, 14 September 2025, https://www.minister.defence.gov.au/media-releases/2025-09-14/additional-defence-funding-deliver-henderson-defence-precinct.
3)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2024 Naval Shipbuilding and Sustainment Plan December 20, 2024, https://www.defence.gov.au/about/strategic-planning/2024-naval-shipbuilding-sustainment-plan.
4)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s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eased June 5, 2025, https://www.abs.gov.au/articles/australias-trade-united-states-america.
5) AUKUS는 2021년 호주‧영국‧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억지력과 상호운용성을 키우기 위해 만든 3자 안보‧산업 협력이다. AUKU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 Abraham M. Denmark and Charles Edel, “The AUKUS Inflection: Seizing the Opportunity to Deliver Deterren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5, 2025, https://www.csis.org/analysis/aukus-inflection-seizing-opportunity-deliver-deterrence.
6) 트럼프 2기 AUKUS 잠수함 협정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Peter Ward, "AUKUS의 향후 전망, 배경, 문제점과 정책 제언," 세종포커스, 2025년 9월 5일을 참고.
7)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Joint Statement on the Australia–United Kingdom Nuclear-Powered Submarine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Treaty,” July 26, 2025, https://www.minister.defence.gov.au/statements/2025-07-26/joint-statement-australia-united-kingdom-nuclear-powered-submarine-partnership-collaboration-treaty.
8)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2024 National Defence Strategy and 2024 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April 17, 2024. https://www.defence.gov.au/about/strategic-planning/2024-national-defence-strategy-2024-integrated-investment-program.
9) "Hanwha Aerospace Signs Redback Engine Assembly, Test and Supply Agreement with Penske Australia," Hanwha Aerospace Press Release, 2025.; "Hanwha's AS9 Huntsman Production and Supply Chain Expansion in Australia," Defense Industry News, August 2025.
10)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Continuous Naval Shipbuilding and Sustainment Enterprise,” accessed September 24, 2025, https://www.defence.gov.au/business-industry/industry-capability-programs/continuous-naval-shipbuilding-and-sustainment-enterprise.
11)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Defence industry builds ties with South Korea," News, August 21, 2025, accessed September 24, 2025, https://www.defence.gov.au/news-events/news/2025-08-21/defence-industry-builds-ties-south-korea.
12) Jennifer Parker, "Australia–South Korea: The case for a new maritime focus," Lowy Institute, May 29, 2025, accessed September 15, 2025,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australia-south-korea-case-new-maritime-focus.
13) “ASC Opens Door to AUKUS Supply Chain,” Australian Defence Magazine, September 22, 2025, https://www.australiandefence.com.au/news/news/asc-opens-door-to-aukus-supply-chain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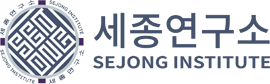
 파일명
파일명